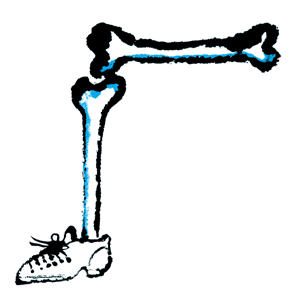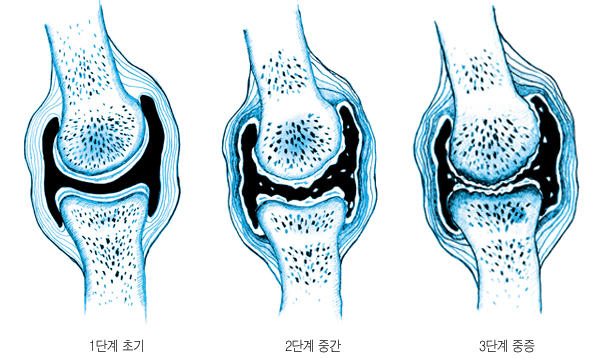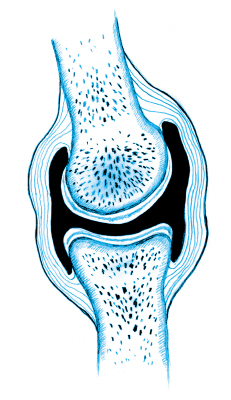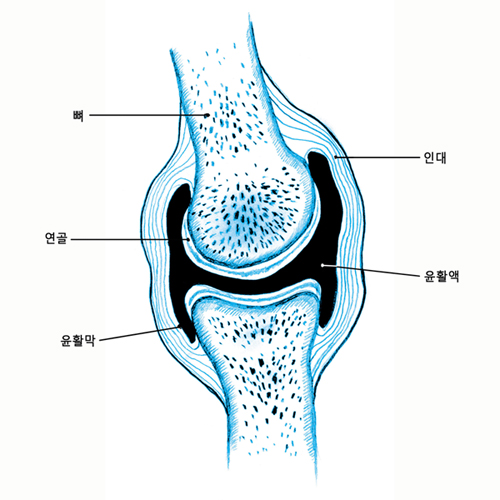몸통의 노예로서의 관절
2020-09-24
조회수 7757
|
|---|
|
대비와 용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보는 연습을 해보았다. 이제 인간의 몸 전체를 있는 그대로 보면서, 몸에서의 관절의 역할을 생각해보도록 하자.
먼저 우리 몸의 주인공, 혹은 가장 중요한 부위는 무엇일까? 평이하게 생각하면 뇌(腦)라 답할 수 있겠으나, 분명 그러한 간단한 질문을 하려는 건 아님을 간파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기로 했고, 그렇게 바라보면 의외의 사실을 깨닫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뇌는 사고하고 판단하고 몸에 명령을 내리는 등 진정한 몸의 주인답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뇌가 몸의 주인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생겼다. 뇌를 몸의 주인이라 믿을 수 없는 막연한 느낌은 바로 종교인이나 수행자들의 깨달음에서 출발한다. 수행을 오래하여 높은 경지에 이른 분들은 종종 “뇌의 활동에 의한 의식은 하늘을 가린 구름과 같고, 너의 본성은 그 구름 뒤의 푸른 하늘이다.”고 말했다. 또 “머리와 작별하고 가슴과 손을 잡아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들의 경지는 알 수 없지만, 뇌가 몸의 주인이 아닐 거라는 의구심이 생기기에는 충분한 깨달음이다. 이들의 깨달음에는 수긍할 만한 근거들이 존재한다. 우선, 우리 몸을 다시 한 번 ‘있는 그대로’ 보자. 있는 그대로 보는 방법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미 알고 있는 것에 큰 의심을 품고 다시 보아야지만 새로운 것이 보인다. 몸통의 노예로서의 관절 우리의 뇌는 팔과 다리에 명령하여 물건을 집게 하고, 걷고 뛰게 한다. 당연한 이야기이다. 또 뇌는 나 자신에게 명령하여 이 글을 쓰게도 한다. 당연한 이야기이다. 뇌는 주인처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에게 이런저런 명령을 계속 내린다. 지난밤에는 술을 한잔 마시자고 하더니 오늘 아침은 해장국을 먹자 한다. 그래서 해장국을 먹었지만 속은 불편하다. 체한 모양이어서 속은 답답하고 쓰리기 그지없다. 나는 뇌에게 체해서 위산(胃酸)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으니 위(胃)에 명령하여 조금 더 힘차게 움직이고 위산 분비를 줄여보라고 부탁한다. 그런데 뇌가 명령을 했는지 말았는지 위는 묵묵부답, 아무런 변화도 없다. 위는 그냥 뭉쳐 있고 위산은 계속 과다 분비되어 나는 괴롭기만 하다. 뇌가 온몸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뇌의 명령을 전혀 받지 않는 장기가 있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위만 그런 것이 아니다. 빨리 뛰는 심장에게도 정상적으로 뛰라고 뇌가 명령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위도, 소장도, 대장도, 심장도, 간도, 허파도, 소위 말하는 중요 장기들은 뇌의 명령체계 밖에 있다! 이들은 생명 유지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장기들이다. 뇌의 명령을 받는 팔다리는 잘려도 살 수 있지만 이들 장기는 단 하나만이라도 작동을 멈추면 죽음이다. 오히려 뇌 기능이 멈추는 뇌사(腦死) 상태에도 복강 내 장기가 작동하면 몸은 살아 있는 셈이다. 몸의 가장 소중한 부위가 뇌가 아니라는 생각이 확실해진다. 지렁이와 같은 동물은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이다. 물고기 정도로 진화되어도 머리와 몸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 진화의 과정을 거치며 고등해질수록 머리는 몸통과 구분되며, 몸통 대비 뇌의 용량이 무거워진다. 뇌의 용적으로 따지자면 당연 인간이 가장 고등한 동물이다. 이 과정을 잘 살펴보면 몸통 자체가 몸의 주인이었고, 그 주인이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해 각고의 노력 끝에 머리를 키워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식을 키워 독립시키듯 머리를 키워 목 위로 우뚝 독립시킨 것이다. 뇌는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개구리 올챙이 적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다 큰 자식 부모 무시하듯 몸통을 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통은 천지불인(天地不仁)하듯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때 몸통은 토(土)이다. 뇌는 토(土)의 대행자이다. 몸통은 성(性)이고 뇌는 정(情)이다. 몸통은 초월계이고 뇌는 현상계이다. 몸통은 푸른 하늘이고 뇌는 그 하늘을 가리고 있는 구름이다. 몸통은 혼돈(chaos)이고 뇌는 질서(cosmos)이다. 몸통 속 내장은 좌우가 없으며 제각각 불규칙한 형태로 무질서하게 섞여 있다.   혼돈(chaos)의 몸통과 질서(cosmos)의 몸 몸통 속 내장은 좌우가 없으며 제각각 불규칙한 형태로 무질서하게 섞여 있다. 몸통 속과 달리 겉으로 드러난 몸은 질서정연하다. 몸이 획득한 좌우대칭의 질서는 천지가 천좌선 지우행(天左旋 地右行)하면서 맷돌처럼 돌아가는 생태 환경에 가장 효율적으로 적응한 결과라 여겨진다. 혼돈(混沌)의 몸통은 토(土)로서 우리 몸의 진정한 주인공이다. 뇌는 몸통에서 분화되어 위로 뻗어나온 토의 대행자이다. 뇌는 제(帝)라 칭하던 고대의 왕과도 같은데, 왕은 진정한 토인 하늘을 대행하는 자일 뿐이다. 몸통이 자신의 원활한 삶을 위해 뇌라는 출장소를 낸 것이다. 뇌의 바로 밑에 눈, 코, 귀, 입까지 열어 뇌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팔다리를 붙여 기동력까지 강화시켰다. 지렁이, 말미잘, 해삼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의 진화이다. 뇌의 명령체계는 주인인 몸통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자기의 신하인 팔다리에게는 끊임없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팔과 다리 등은 뇌의 명령에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좌우가 대칭이다. 그래서 몸통 속과 달리 겉으로 드러난 몸은 질서정연하다. 몸이 획득한 좌우대칭의 질서는 천지가 천좌선 지우행(天左旋 地右行)하면서 맷돌처럼 돌아가는 생태 환경에 가장 효율적으로 적응한 결과라 여겨진다. 이제 몸의 겉을 다시 보자. 머리는 예전처럼 중심으로 여겨지지 않고 몸통의 집사 정도로 보일 뿐이다. 머리가 집사이면 팔다리는 말 그대로 머리의 수족(手足)이다. 팔과 다리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고달픈 노동을 한다. 평생 머리의 명령을 받는 노예나 다름없다.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시각으로 바라보면 몸의 체계와 중요도는 이제 다른 모습으로 재편된다. 이러한 시각은 한의학에서는 이미 당연스레 받아들여지고 있다. 《동의보감》의 ‘편제(篇第)’를 살펴보면 오장육부(五臟六腑)가 가장 먼저 소개되고, 그 뒤를 이어 ‘외형편(外形篇)’에 머리[頭], 귀·눈·입·코[耳目口鼻], 등[背], 배[腹], 뼈[骨], 팔[手], 다리[足]가 순서대로 나온다.  |